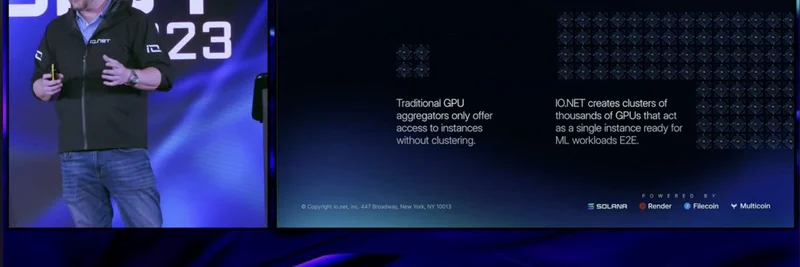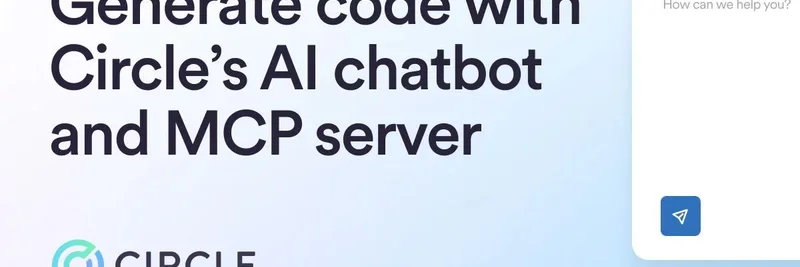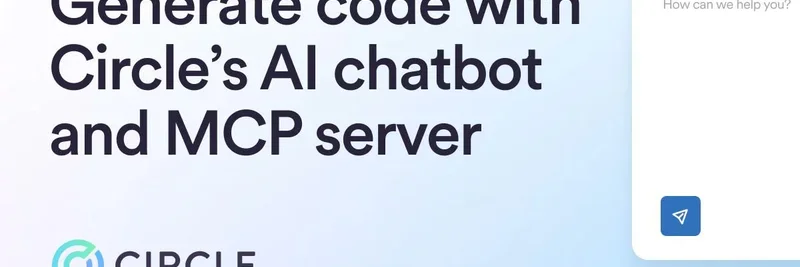속도감 있는 밈 토큰과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딜이 몇 초 만에 국경을 넘어 이뤄질 수 있어 문화적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다. 최근 @MarmotRespecter가 X(전 Twitter)에 올린 바이럴 쓰레드가 (https://x.com/MarmotRespecter/status/1969081167149482334) 인도와 중국을 비롯한 특정 문화권과 협상할 때 서구권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명한다. 쓰레드는 자동차 딜러십 사례를 들었지만, 글로벌 투자자나 파트너와 일해본 암호화폐 관계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통찰을 제공한다.
쓰레드는 @racistnature가 Mercedes 딜러십에서 겪은 좌절 경험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첨부된 영상에서 인도 구매자는 광고가보다 훨씬 낮은 현금가를 강하게 요구하고 세금과 수수료를 "사기"라고 치부하며 밀어붙인다. 판매자는 반복해서 그런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구매자는 "you can do"라며 계속 밀어붙인다. 기대치의 정면 충돌이다.
거래 협상을 직업으로 하는 @MarmotRespecter는 이렇게 말한다: "사기/낮은 신뢰(인도)의 문화권과 상대를 '이기지' 않으면 자존심에 상처가 되거나 '지능이 낮다'는 표시로 여기는 문화권(중국) 사이에서 서구인이 협상할 때 거의 불가능한 장벽이 있다." 그는 큰 구매 같은 고액 상황—이를 밈 토큰 투자나 파트너십으로 확대해서 생각해보면—에서 누군가의 평생에 걸친 사고방식을 바꾸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이 주제는 밈 토큰 커뮤니티에서 크게 공감된다. Dogecoin 같은 밈 토큰이나 마멋 같은 동물에서 영감을 받은 최근 토큰들은 다양한 국제적 유저를 끌어들인다. 인도와 중국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막대한 유동성을 가져오지만 거래 접근법은 다르다. 토큰을 출시하거나 VC와 협상하는 블록체인 실무자들에게 이런 문화적 통찰은 골칫거리를 예방할 수 있다.
@DissidentSoaps의 답글은 낮은 신뢰 마인드를 잘 짚어낸다: "북서 유럽의 협상 개념은 양측이 대체로 만족/불만족을 공유하면서 향후 거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반면 일부 문화권은 일방적인 승리를 노려 장기적 관계를 망칠 수 있다—커뮤니티 신뢰가 가치의 핵심인 변동성 큰 밈 토큰 시장에서 치명적이다.
또 다른 사용자 @disinfospreader는 이렇게 나눈다: "평균적인 미국인은 우리가 직장 환경에서 겪는 인도 사람들에 대한 피로도를 전혀 모른다." 여러 명이 모여 차를 팔 때 집단으로 강하게 흥정하는 이야기들은 암호화폐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그룹에서 협상이 마라톤으로 변하는 경험과 닮아 있다.
@WeaponOutfitter는 중국 쪽을 이렇게 덧붙인다: "본토 사람들은 협상에서 체면이 전부다.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 @MarmotRespecter는 응수한다: "인도인은 물질적 이득을 원해서 당신을 속이려 하고, 중국인은 똑똑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서 당신을 속이려 한다."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시아 거래소나 대형 투자자와 마주할 때 블록체인 관계자들이 실제로 겪는 경험에 기반한 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willoughby_li가 지적하듯 이런 흥정 방식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들이 다른 인종에 비해 더 '과세'(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추가 마진 부과)를 당한다. 골칫거리라서." 밈 토큰에서는 추가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더 높은 수수료나 덜 유리한 조건이 붙을 수 있다.
블록체인 실무자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스타일을 조정하라. 초기에 신뢰를 쌓고 tokenomics나 airdrops 같은 절차를 투명하게 설명하며, 때로는 상대가 양보를 해서 '이겼다'고 느끼게 해주라.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s) 같은 도구는 규칙을 자동으로 집행해 사기나 체면 싸움의 여지를 줄여준다.
이 쓰레드는 조회수 60만 회가 넘을 정도로 단순한 유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글로벌 밈 토큰 무대에서 문화적 교양은 기술적 역량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상기다. 국제 딜에 뛰어들 계획이라면 이 쓰레드를 확인하고 협상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