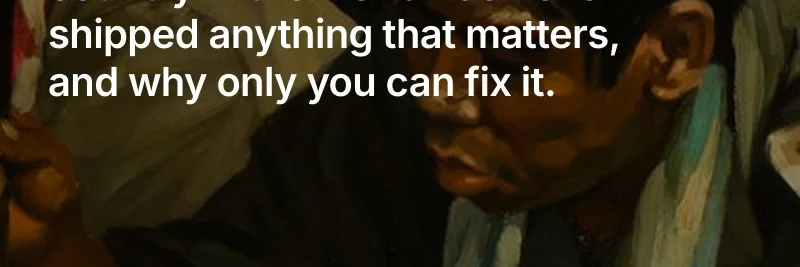급변하는 블록체인과 밈 토큰 세계에서 싱가포르는 눈에 띄는 허브다—낮은 세율, 탄탄한 규제, 글로벌 인재의 유입을 떠올려보라. 그런데도 왜 라이온 시티(싱가포르)에서 게임 체인저급 기업이나 혁명적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는 걸까? 최근 X(구 Twitter)에서 @hoeflatoor가 남긴 바이럴 스레드는 @eigen_moomin의 도발적인 글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들이 특히 공감할 만한, 거칠고 시적인 관점이다.
논쟁은 @eigen_moomin의 대담한 주장으로 시작된다: 싱가포르는 “중요한 것을 배출해본 적 없는 가장 높은 IQ 국가”라는 것이다. 그들은 싱가포르인을 “compradors” 즉 창조하기보다 제공하는 중개자라고 규정한다. 이 예고는 그들의 서브스택 에세이 “If you meet the Singaporean on the road”로 연결되며, 왜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나라가 의미 있는 혁신에서 뒤처지는지를 탐구한다.
국가복무를 마친 뒤 거의 십 년 가까이 싱가포르를 떠나 있던 @hoeflatoor는 이 비판에 더 깊이를 더한다.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은 유교적(Confucian) 순응에 집착하는 환경에서는 천재성이 번성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유교는 계급, 권위에 대한 존중, 사회적 조화를 강조한다—안정에는 좋지만 블록체인 개발이나 바이럴한 밈 토큰 출시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를 죽이는 요인이다.
스레드는 싱가포르의 덥고 습한 기후와 ‘쥐 유토피아’ 같은 대도시 구조가 창의성을 억제한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은 코드나 예술, 위험한 도전에 실험할 시간보다 물질적 안락—그 '철밥통'(안정된 직장과 재정적 안전)—을 쫓느라 바쁘다. 밈 토큰 영역에서는 성공이 종종 기이하고 비선형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오는데, 희소성과 주의가 우선인 문화는 내수에서의 히트작 탄생을 저해한다.
스레드는 문화적·유전적 요인도 거론한다. 규범을 깨고 성공한 지역 롤모델이 없으면 순응 성향은 더 강해진다. 싱가포르는 유럽, 중국 등지에서 인재를 수입하지만 현지인들은 일상 노동에 갇힌다. 악명 높은 “Sinkie pwn sinkie” 마인드—영국식 근엄함과 중국식 체면 문화의 혼합—는 사람들끼리 지위와 돈을 위해 서로를 깎아내리는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진다.
블록체인과 연결지어 보면, @hoeflatoor는 진정한 가치 창조보다 'filthy fiat' 숭배를 강조한다. 영어 구사력, 학업 성취, 동서 문화를 잇는 독특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아이디어를 합성해 특별한 무언가로 만드는 데 실패한다. 밈 토큰 창작자에게 이는 파생 거래와 중개자 역할에 더 초점을 맞춘 문화라는 의미로, 파괴적인 프로젝트를 출발시키기보다는 거래에 치중하게 만든다.
데이트 문화도 언급된다—여성들이 재정적 안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순응을 강화해 가장 전통적인 사람들만 번식하게 된다. 낮은 출산율과 맞물려 혁신적 사고를 가진 인구 풀을 제한한다. 전통적으로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창조를 이끈 남성들은, 영재 프로그램 자리 싸움이나 PSLE(싱가포르의 초등학교 졸업시험) 같은 경쟁을 어린 시절부터 가르치는 시스템 속에서 의욕을 잃는다.
기후도 영향을 미친다: 적도 근처의 더운 날씨는 사람들을 자연에서 멀어지게 하고 에어컨이 있는 실내 안전지대로 몰아넣는다. 사계절이 없다는 것은 성장의 순환을 체감할 기회가 적다는 의미여서, 비유적으로 블록체인 생태계나 밈 커뮤니티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순환 감각을 약화시킨다.
@hoeflatoor는 현지의 잠재적 천재들—예컨대 싱가포르 출신의 음악적 영재 Jacob Collier 같은—이 시스템에 의해 좌절되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영국의 식민 유산, 유교 사상, 이민자 선발 편향이 섞여 효율적이지만 영혼 없는 기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리콴유(Lee Kuan Yew) 시대의 정책들도 비판받는다—교육을 가족보다 우선시하고 ‘Stop at Two’ 캠페인으로 인구구조를 뒤흔든 정책 등. 국가복무는 젊은 남성의 2년을 빼앗아 교육과 경력에서 뒤처지게 만들고, 외국인들은 기회와 파트너를 차지한다.
스레드는 문화적 침식의 생생한 그림을 그린다: 호커 센터(길거리 음식 시장)의 고유한 맛이 글로벌 체인에 잠식되고, 어린 시절 골목이 인플레이션과 자산 버블로 획일화된다. 베이비붐 세대는 실현되지 않은 자산 이득을 붙잡고 젊은층에게 ‘부트스트랩’하라 말하는 반면, 중산층은 급히 콘도 트레이드로 수익을 좇으며 동족을 ‘exit liquidity’로 삼는다—블록체인 업계가 러그풀에서 익히 아는 용어다.
현 총리 Lawrence Wong은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bloodstake'가 부족하다고 비판받는데, 이는 미래와 단절된 리더십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이는 쇠퇴의 전조로 보인다: 낮은 출산율, GDP 부양을 위한 이민, 임금 하락, 동기를 갉아먹는 자산 인플레이션.
반짝이는 외관—MRT 역, 손질된 도로—아래에는 영적 공허가 자리한다. 인간성을 근대성으로 바꾸어 버린 셈이다. 블록체인 실무자들에게 이 스레드는 경종이다: 싱가포르의 금융과 규제 강점은 훌륭한 베이스를 제공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이러한 문화적 족쇄에서 벗어나는 것을 요구할지 모른다. 아마도 밈 토큰처럼 반항적이고 커뮤니티 중심적인 것이 순응에 도전하는 불꽃이 될 수 있다.
이 스레드는 @0xHuu, @0xRyze 같은 크립토 인사들로부터 깊이를 칭찬받으며 반응을 일으켰다. 어떤 답글은 @hoeflatoor를 현지적 색채와 문학적 강인함을 섞어 “Bishan Bukowski”라고 불렀다.
블록체인에 종사하거나 밈 토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면, 이 논쟁은 싱가포르 현장을 헤쳐나갈 때 유용한 맥락을 제공한다. 전체 스레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x.com/hoeflatoor/status/1963272394736361805